유색인종 여성을 위한 웹진 ‘갈덤(gal-dem)’ 편집장 리브 리틀을 만나다

스물다섯 살에 전 세계 수백 명의 필진을 둔 웹진 ‘갈덤(gal-dem)’의 편집장이 된 리브 리틀을 처음 본 건 올해 초 한 행사장에서였다. ‘미디어에서의 유색인종 여성’이라는 주제로 런던 중심가의 한 여성전용클럽에서 열린 강연에 연사로 참여한 그는 발랄하면서도 다부졌다.
유색인종 여성 혹은 논바이어리(non-binaryㆍ한쪽 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출판하는 공간. 여자애들 무리라는 뜻의 ‘gal-dem’을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로 명명한 이 영국 잡지는 전 세계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다.
이날 행사는 흑인과 라틴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유일한 동양인이라는 설움이 컸던 터라 말미에 “영국 언론사에 아시아 여성이 있기는 하냐”고 물었다. 여기서 매일같이 신문을 읽고 있지만 아시아 여성 기자의 이름이 눈에 띈 기억이 없었다. “인구 대비, 아시아 여성이 언론계에서 소외된 것(under-represented)이 사실”이라는 언론인 아푸아 허시의 짧은 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2012년 보고서만 봐도 2011년 영국 인구 87%를 차지하는 백인이 언론계에서는 94%에 달했다. 반면 영국 인구 약 7%의 아시안은 전체 언론인 중 2.5%에 불과했다. 흑인 언론인의 현황은 더 처참했다.
이런 생각을 한국에 대입하면 걱정이 깊다.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의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11월 기준 186만명. 인구의 약 3.6%를 차지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의 뉴스룸에서 외국인(혹은 혼혈) 기자 한 명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들에게 기고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리브 리틀의 도전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는 주류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뤄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쓰고 출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적극적인 방식을 택했다.
캐리비안계 흑인으로 런던 남부에서 나고 자란 리틀은 브리스틀대학에서 정치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다. 런던은 2011년 기준 유색인종 비율이 40%에 달하는데다, 그가 살던 지역은 흑인 시장이 선출될 정도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런던에서 남쪽으로 200여㎞ 떨어진 브리스틀은 달랐다. “백인 중심의 사고방식뿐이었어요. 어디에도 흑인에 대한 고려는 없었죠. 매일 울고 싶었어요.”
리틀은 대학에서 처음 페미니즘을 접하던 때를 회상했다. “남녀 임금 격차를 다루는데, 모두가 백인 여성과 백인 남성을 비교하지,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의 격차를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동료들이 필요했다. 그렇게 2015년 스물한 살의 가을, ‘갈덤’을 창간했다. 그는 “작은 이기심이 동력이 됐다”라며 웃었다.
1970년대 영국에서 흑인 여성으로 영화를 공부한 어머니와 인권활동가인 이모 등 시대를 앞선 집안 여성들의 영향으로 리틀은 “내 목소리도 마땅히 가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자랐다. 자본은 없었지만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있었다. 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다”라며 “언론에 내 이야기가 마침내 제대로 다뤄진다고 느낀 젊은 유색 여성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했다.
갈덤은 인종과 페미니즘 관련 콘텐츠를 골격으로 한다. ‘넷플릭스의 한 방송이 인종차별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거나 ‘여성의 생리를 더욱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캠페인과 같은 글들이 눈에 띈다. 여기에 고유한 시각의 대중문화와 생활정보 기사가 생기를 불어넣는다. 유색인종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백인 중산층 이상 기자들로 구성된 영국 기성 언론과 차별화된다. ‘포르노 배우 세계에서도 인종 간 임금 격차가 있다’는 기사를 대체 갈덤 말고 어디에서 읽을 수 있을까.
지난해 여름, 갈덤 편집진은 영국의 대표 일간지 가디언의 주말판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갈덤의 기사들이 새로운 독자를 만나는 시간이었다. 반대로 권위적인 신문지상에서 소외감을 느껴왔던 유색인종 소녀들도 흥분에 찬 소감을 보내왔다. 리틀은 “뉴스룸에서 유색인종 기자들은 다양성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변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며 “주류 언론에 우리 시각이 더 많이 노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일푼에서 시작한 갈덤은 곧 7명의 풀타임 직원과 함께 새도약을 꿈꾼다. 온라인 미디어조차 곳곳에서 구조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주목할만한 행보다. 기성 언론사에 비해 몸집은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오프라인 잡지가 테이트모던 미술관과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 등 런던의 굵직굵직한 명소에 비치됐고, 미국, 독일, 대만 등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창간한 지 4년. 리틀은 새로운 세대 발굴의 중요성을 벌써부터 실감하고 있다. 독자가 여성만 있는 건 아니다. 30%는 남성이다. “저희 주 독자층은 15~35세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편집권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찾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싫증나면 안되잖아요(Don’t be jaded).”
최근 한국의 성평등운동에 십대, 이십대 초반 여성의 활약이 눈부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매체가 생겨날 토대는 충분하다. 한국에 갈덤과 같은 매체가 생긴다면 어떤 모습일까. 결혼이민여성이 기사를 편집하고,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외국인 팬이 투고하는 편집국의 풍경을 상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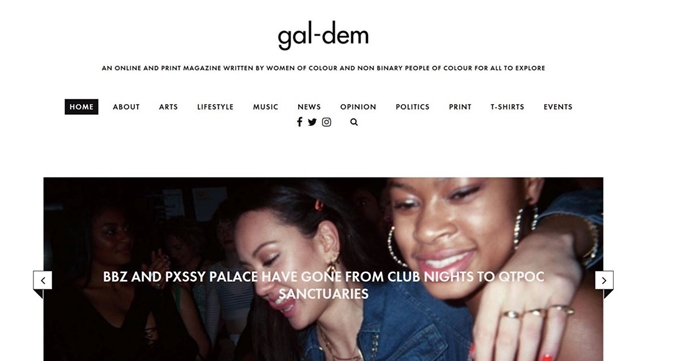
갈덤(gal-dem) : http://gal-dem.com/
참고자료 : “Journalists in the UK”(2012),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in England and Wales”(2011), ONS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